
부부싸움! 근데 50대쯤 되면 그 단어조차 좀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다. “싸움은 무슨… 그냥 말이 없지” 말이 없는 게 무서운 거다. 정적이 습관 되고, 눈치가 말이 되는 시절. 그럴 땐 상담소 문 두드리기 전에… 진짜 효과 있는 거,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.
싸움은 줄었는데, 싸한 건 늘었다
부부싸움은 젊을 때가 낫다. 크게 싸우고, 크게 풀고, 술 한 잔 하고 울고불고 하고 끝났으니까. 50대가 되면 싸움 자체가 없다. 대신 싸한 공기가 있다. 말은 안 하지만 다 안다. 알지만 말 안 한다. 이게 오래가면… 집 안이 조용한 전시장 같다. 전시된 식탁, 전시된 침대.
심리상담받으면 좋다고들 하던데, 물론 좋다. 근데 솔직히… 그거 예약하기 전에, 한 번쯤 해볼 거 있다. 그냥 평소에 안 하던 거.
가령 뭐,
- “오늘도 피곤했지?”
- “나 옛날에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더라.”
- “이 찌개, 내가 했어. 망했지?”
의외로, 이런 쓱 던진 말 한마디가 상담보다 먼저 균열을 낸다. 관계라는 게, 꼭 전문가 손 거쳐야만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.
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‘기대 없음’
20~30대 땐 "왜 그렇게 말해!" 이러면서도 기대가 있었다. 근데 지금은 기대가 없어서, 말도 없다. 그냥 서로 각자의 방, 각자의 드라마, 각자의 유튜브 알고리즘. 그게 편하긴 하다. 하지만 편하다고 좋은 건 아니다.
50대 부부싸움은 감정 폭발보다, 기대 단절에서 시작된다. "아, 쟤는 원래 저래." "말해도 바뀌는 거 없어." 이런 생각이 마음 안쪽에 텐트 치고 눌러앉는다. 그럼 더 말 안 하게 된다. 조용한 게 편하다 착각하면서.
그럴 땐 거창한 상담보다, 그날그날 대화 한 끗, 몸짓 하나로 작은 균열부터 내는 게 낫다.
예를 들어,
- 밥 먹을 때 폰 내려놓기
- “그때 내가 좀 그랬지…” 같은 한마디
-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서 등 툭 치기
좀 뻘쭘해도 해보면… 의외로 그 뻘쭘함이 관계를 다시 사람 냄새나게 한다.
진지함보다 넉살, 그리고 웃음기
정색하고 “우리 대화 좀 해”보다, “야, 내가 오늘 드디어 설거지함. 박수 좀” 이런 게 낫다.
진짜. 진지한 얘기 자주 꺼내면 피로감 쌓인다. 그 대신 웃기고 허술한 사람 하나쯤 되는 게 낫다. 그게 나면 더 좋고. 아니, 가끔 나도 좀 그런 사람 돼야 한다. 그래야 내가 먼저 긴장을 풀고, 상대도 그 여백을 따라온다.
- 일부러 못생긴 표정 지으면서 설거지 시작
- "내가 오늘 승질 좀 안 부렸지? 인정 좀"
- "자기 잔소리 듣는 게 이제… 좀 편하더라" (농담 반 진심 반)
이런 넉살과 유머는 대화의 윤활유이자, 사랑의 재점화 스위치 같은 거다. 꼭 큰 감정이 오가야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. 가끔은 ‘피식’ 한 번이 서로를 끄집어내는 기적을 만든다.
물론, 상담은 필요하다. 근데 꼭 그게 첫 번째일 필요는 없다. 관계는 진단보다 접촉이고, 구조보다 감정이다. 그리고 그 감정은 거창한 대화보다 작은 시도에서 살아난다.
“이 나이에 뭘…” 이런 말은 그만하자. 지금도 늦지 않았다. 상담실 문보다 더 먼저 열어야 할 건… 냉장고 문 열고, 반찬 하나 더 덜어주는 손일 수 있다.
오늘 밤, 진짜 별일 없으면 이렇게 말해보자. “나… 그거 먹고 싶다. 그거, 당신이 해주는 거.” 그 말 한마디가, 진짜 시작일 수 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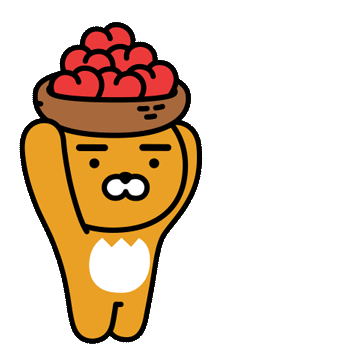
'관계.소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은퇴 부부 갈등 줄이는 대화법 (갈등해결, 소통방법, 관계회복) (9) | 2025.08.14 |
|---|---|
| 중년의 늦둥이, 요즘 육아법 (소통, 행복, 계획) (11) | 2025.08.12 |
| 💔 40대,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(중년의 이혼, 자립, 감정정리) (4) | 2025.07.24 |
| 40/50대 외국인과의 연애? 지금이 제일 뜨거운 때 (6) | 2025.07.24 |



